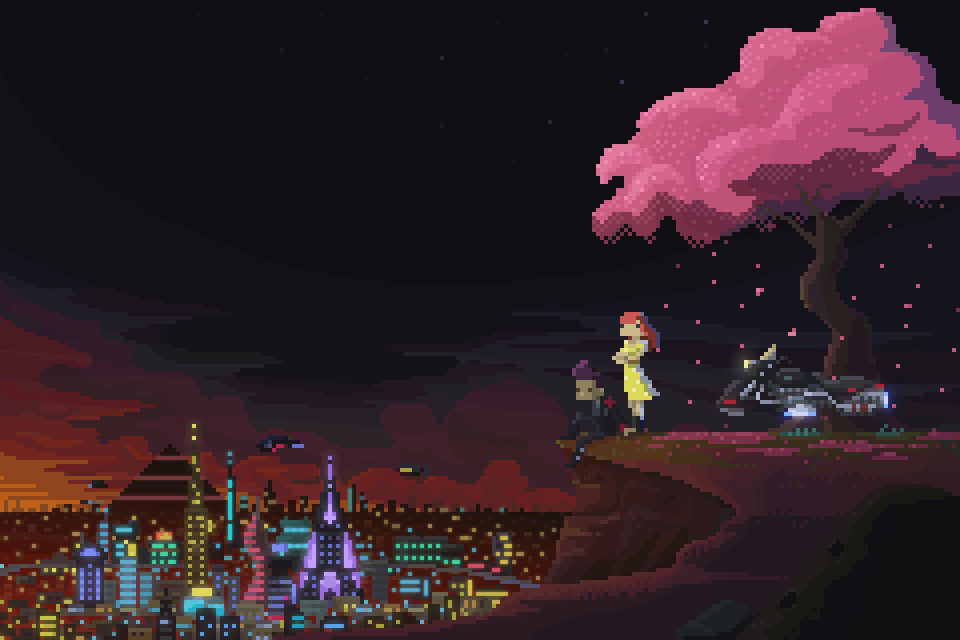
소설 같은 삶은 소실되어 사라지고
#1,
ID:
2fbfef
-
| 삼류조차 되지 못한 문장이라도
내 삶이기에 나에겐 가치있어.
내 삶이기에 나에겐 가치있어.
#2,
ID:
2fbfef
-
| 가장 옛 기억은 5살 때의 어느날의 기억이다.
끊긴 필름처럼 결손되고, 흐려진 기억이지만,
그 기억의 존재 자체는 잊을 수 없는,
사라진다면 눈치챌 수 밖에 없도록 커다란
기억이라, 그 존재 자체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다.
부서지는 현관문의 창, 불쑥 파고들어오는 손,
잠긴 방문에 울리는 노크소리.
똑똑.
잠시의 정적이 후, 또다시
똑똑똑.
그리고는
쾅.
쾅.쾅.쾅쾅.꽈앙..빡.뚜뚝.
우그러진 손잡이가 우스꽝스럽게 돌아가고,
태연한듯 들어와 담배를 챙겨 등을 돌리는
안개.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한쌍의 눈과
그 눈을 감싸안고 가볍게 몸을 떠는 가냘프고
억센 들풀 하나.
대체 무엇이 이 작은 방을 박살낼 이유였을지
수없이 고민한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닌데,
아, 태어난게 잘못인가?
별 진지한 고민없이 떠올린 답이
사실은 본질에 가깝다는걸
그 아이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스스로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절망을
애써 피하려 도망쳤을 뿐.
끊긴 필름처럼 결손되고, 흐려진 기억이지만,
그 기억의 존재 자체는 잊을 수 없는,
사라진다면 눈치챌 수 밖에 없도록 커다란
기억이라, 그 존재 자체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다.
부서지는 현관문의 창, 불쑥 파고들어오는 손,
잠긴 방문에 울리는 노크소리.
똑똑.
잠시의 정적이 후, 또다시
똑똑똑.
그리고는
쾅.
쾅.쾅.쾅쾅.꽈앙..빡.뚜뚝.
우그러진 손잡이가 우스꽝스럽게 돌아가고,
태연한듯 들어와 담배를 챙겨 등을 돌리는
안개.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한쌍의 눈과
그 눈을 감싸안고 가볍게 몸을 떠는 가냘프고
억센 들풀 하나.
대체 무엇이 이 작은 방을 박살낼 이유였을지
수없이 고민한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닌데,
아, 태어난게 잘못인가?
별 진지한 고민없이 떠올린 답이
사실은 본질에 가깝다는걸
그 아이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스스로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절망을
애써 피하려 도망쳤을 뿐.
내 아이디: 8bc61d